그런데 가슴을 뛰게 한 곳은 고구려도, 백두산도 아니고 압록강이었다.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는 국경도시 단둥(丹東)에서다. 고구려 박작성이 중국 동북공정으로 만리장성의 동쪽 출발점으로 변했다는 것도 놀랍지 않았다. 수·당나라 침략에 대비하던 고구려성이 이렇게 중국성으로 바뀌었어도 그리 화가 나지 않았다. 역사 왜곡은 중국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압록강 유람선을 타면서 가슴이 쿵닥거렸다. 북한 주민들이 눈에 들어오면서다. 강가 경사면에서 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보였다. 하나같이 몸은 마르고 옷은 남루했다. 한 중년 여성관광객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 사람 손으로 밭을 가나? 트랙터 한 대 사주고 싶다”고 했다. 공감이 갔다.
![[조한필의 視線] 압록강가 북녘 동포와 끊어진 다리](/data/kuk/image/2024/06/04/kuk202406040029.680x.9.jpg)
동승한 젊은 재중교포(‘조선족’ 대신 이렇게 불러주길 원했다) 여성 가이드가 자신이 목격한 궁색한 북한 주민 생활상을 전했다. “강가에서 수영하는 아이들을 향해 과자·돈 등을 흘려 보내면 접근해서 건져간다”고 했다. 손바닥만한 밭을 일구는 여인이 있었다. 바로 옆에 두세 살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흙장난하고 있었다. 이 아이도 더 크면, 강 건너 중국에서 떠내려 보내주는 물건을 줍는 신세가 되려나.
슬퍼졌다. 어떻게 우리 민족 ‘한 부분’이 중국 쪽에서 불쌍하게 여기는 존재가 됐을까. 1500여년전 광개토왕이 만주를 호령한 것이 지금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자랑이 될까. 백두산 정기 받은 민족이 이런 꼴이 된 마당에 그 산을 보러 왔다니. 수양제·당태종의 침입을 물리친 고구려 기상은 온데간데 없다.
강가에 북한군 국경초소가 보인다. 군인 10여 명이 밭을 개간하고 있었다. 부식을 자급자족하는 모양이다. 가이드 말이 “최근 군복무기간이 13년으로 늘었다”고 했다. 혈기왕성한 시기를 군에 잡아둬 반발심이 누그러지게 하려는 속셈이란다.
다른 날, 단둥의 끊어진 압록강 다리[斷橋]를 보러 갔다. 100여 년전 일제가 건설한 철교인데 1950년 11월 미군 폭격으로 파괴됐다. 휴일이라 중국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런데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6·25전쟁 때 “중국이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여기는 역사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의 역사교육 현장이다. 교량 위에는 참전관련 사진들이 10여 장 전시되고 있었다.
중국인들이 ‘항미원조 승리’ ‘지원군 개선귀국’ 판넬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유람선 선착장서도 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동상과 참전 비행기 전시물에서 사진을 연신 찍어대던 그들이었다. 끊어진 다리 끝에서 비장한 음악과 함께 국뽕 참전 영화를 상영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다리 위에서 예닐곱 중년 남성들이 행진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걸 동료가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다. 압록강 단교는 중국인 애국심 고취 장소였다.
압록강 강폭이 좁은 곳은 예외 없이 양 편에 철책이 있다. 북한은 넘어가지 못하게, 중국은 넘어오지 못하게. 중국에 탈북자는 반갑지 않은 존재다. 중국으로선 북한은 74년 전엔 도와줘야 하는 존재, 지금은 불쌍해 혀를 차게 하는 존재다.
최근 북한은 남한의 탈북자단체가 북으로 전단지를 띄워 보낸다는 이유로 남으로 오물 담은 풍선을 보내고 있다. 압록강가에서 그 오물을 뒤집어 쓴 더러운 기분이었다. 그리고 가슴이 아렸다.
![[조한필의 視線] 압록강가 북녘 동포와 끊어진 다리](/data/kuk/image/2024/06/04/kuk202406040030.680x.9.jpg)
/천안·아산 선임기자 chohp11@kukinews.com
![[조한필의 視線] 압록강가 북녘 동포와 끊어진 다리](/data/kuk/image/2024/06/04/kuk202406040031.632x.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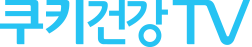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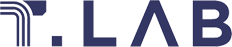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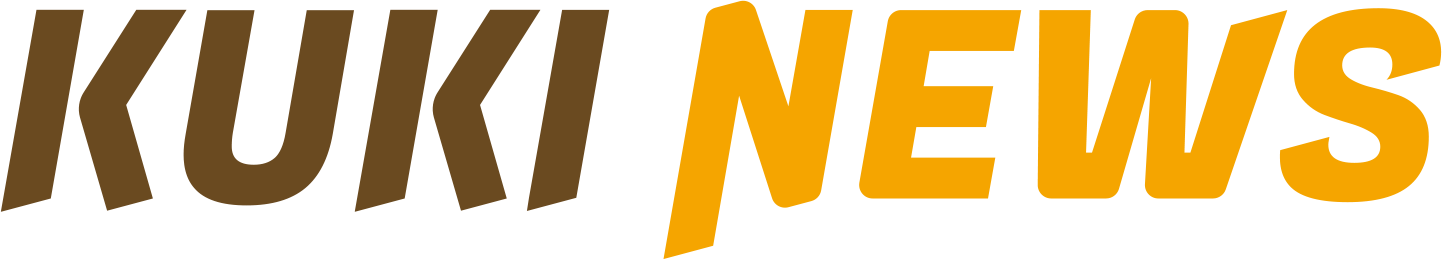



![尹 지지율 2주 연속 26%…국힘 32%‧민주 28% [갤럽]](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21/kuk202406210192.275x150.0.jpg)



![요기요, 8월 자율주행 로봇 배달 시작 外 쿠팡·GS25·NS홈쇼핑 [유통단신]](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21/kuk202406210148.275x150.0.jpg)
![[속보]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중단…“환자 피해 둘 수 없어”](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275x150.0.jpg)






















![[기고] 안전을 챙기는 노력은 끝이 없어야 된다.](/data/kuk/image/2024/06/21/kuk202406210096.68x68.0.jpg)
![[기고] 장마철, 안전하고 쾌적한 집안 환경 만들기](/data/kuk/image/2024/06/20/kuk202406200110.68x68.0.jpg)

![[포토]'2024 여성발명왕 EXPO' 개막](/data/kuk/image/2024/06/20/kuk202406200339.300x20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