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그 멀고도 가까운 [나의북한유학일기]](/data/kuk/image/2023/05/07/kuk202305070001.680x.9.jpg)
지난 2011년 3월 어느 날, 나는 중국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 목적지는 평양이었다.
북한 고려항공의 비행기가 작아서 비행시간 동안 많이 흔들렸다. 멀미를 참고 착륙하는 순간을 간절히 바라면서 눈을 감았다. 다행히도 심양과 평양은 가까웠다. 비몽사몽간에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맡은 공기에 낯선 냄새가 났다.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18세도 되지 않은 내가 홀로 언어도 모르는 타지로 가야 한다는 슬픔에 모든 것이 부옇게 보였다.
약속한 시각에 맞춰 나를 데리러 온 선생님과 선배를 만났다. 유학생들이 처음에 왔을 때도 방학 때도 공항이든 기차역이든 학교 선생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숙소로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도착 날짜와 시간을 선생님과 공유해 왔다. 그때 나는 조선어를 몰랐다. “니 하오” 어색하게 중국어로 인사를 드렸다. 다행히 마중 나온 선배들이 모두 중국 유학생이었다. 남자 선배들의 도움으로 작은 버스에 무거운 짐을 실어 숙소로 돌아왔다.
버스 안에서 선배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창밖에 펼쳐진 길거리를 봤다. 3월의 평양은 쌀쌀했다. 한참을 달려가니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평양역을 지나면 숙소가 나온다. 평양에 온 이후로 서평양역에 걸린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는 나의 위치를 판단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점점 고향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다.
모란봉 산책
나는 유학생 신분이라 관광객만큼 이동 제약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학생이 일상에서 탐색할 수 있는 곳은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제한됐다. 날씨 좋은 봄과 가을에는 친구들과 함께 산책으로 시간을 보냈다. 지도도 없이 숙소를 중심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녔다. 산책 중 맛있는 새 음식점을 발견하면 큰 횡재라 여겼다.
숙소 근처에는 모란봉이 있었고, 작은 언덕을 올라가면 식빵을 잘 만드는 빵집 하나가 있었다. 그 덕에 저녁을 먹은 후에는 빵을 사러 가고는 했다. 봄이면 그 거리에서 조선옷과 양복을 입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사진을 찍었다. 무심코 들어선 작은 갈림길에선 사생하는 화가와 데이트하는 커플들이 있었다.
사람들의 웃는 모습, 수다 떠는 모습, 친밀하게 붙어 있는 어깨. 경치 좋은 언덕에서 편하게 쉬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곳 사람들과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유학 오기 전 TV에서 봤던 인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누군가와 우연히 눈이라도 마주쳐, 내가 낯선 존재라는 걸 그들이 알아채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들의 거리낌 없이 나를 훑었다. 의혹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당신 누구요?’라고 묻는 것 같았다. 그런 직설적인 시선은 북한 유학 생활 내내 지속됐다.
처음엔 불편한 마음에 먼저 시선을 피했다. 나중엔 서로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다. 내가 모란봉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관찰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북한 사람들도 유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과 함께 새로 개업한 식당에 갔었다. 식당 입구에서 흑인 웨이터가 인사하며 손님을 맞고 있었다.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을 본 적이 없었던 내겐 무척 신기한 일이었다. 흑인 웨이터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나는 선뜻 악수하지 못했다. 무서워서 피한 건 아니었다. 짧은 시간 안에 나와 그 웨이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식사 중 부모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차이는 피부색과 언어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식당을 나갈 땐 내가 먼저 악수를 청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다.
‘우리가 심연을 들여다보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는 니체의 말이 생각난다. 그때 나는 어떤 시선으로 웨이터를 봤을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본 북한 사람과 같았을까.
안녕 아메리칸
평양 고급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면 외국 수입 제품이 가득하다. 나와 다른 유학생들은 간식이나 생활용품 사러 일주일에 한 번씩 숙소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갔다. 좀 멀리 가고 싶을 때는 창전거리에 있는 ‘해맞이 식당’까지 가기도 했다. 명칭은 식당이지만, 슈퍼마켓, 커피숍, 음식점 등이 있는 쇼핑몰이다.
날이 추웠던 어느 날 나는 모자를 쓰고 룸메이트와 같이 해맞이 식당에 갔다. 미국 국기를 수 놓은 모자였다. 왜 굳이 미국 국기가 그려진 모자를 북한까지 챙겨왔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 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모자를 쓰고 마트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진열대 사이에 서양인 남자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진열대를 지나친 서양인이 다시 뒷걸음으로 돌아와 내 모자를 가리켰다. 미국 국기가 맞냐고 영어로 물었다. 사실 이전에도 북한에서 그 모자를 쓰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질문을 한 사람은 없었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매우 반가워하며 같이 온 친구들을 나에게 소개했다. 자기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했다. 그들은 중국어로 본인들은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수업 가르치고 있고, 전에는 베이징에서 5~6년 가까이 공부했다고 했다. 우리는 미국인이 북한에서 수업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과 중국인이 북한에서 유학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서로 감탄했다. 일상에서 받는 감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북한 사람들은 의욕 없이 형식적인 노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다.
즐거웠던 대화는 마트 직원의 요구로 마무리됐다. 외국인 네 명이 대화를 나누자, 직원들은 긴장하고 있었다. 경계도 심해졌다. 직원들은 우리에게 빨리 계산하고 나가라고 재촉했다.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고 헤어졌지만, 북한에 사는 이방인들이 잠시 생각을 나눈 시간이었다. “반가워, 아메리칸!”
기고=육준우(陆俊羽)·중국인유학생
홍익대학교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수료. 홍익대학교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졸업. 북한 김형직사범대학교 학사졸업(조선어전공)
am529junwo@gmail.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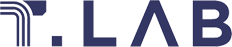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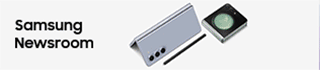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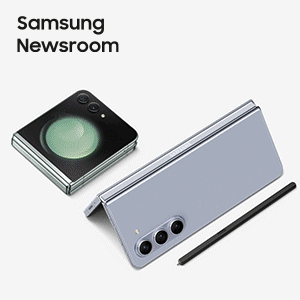
 포토
포토





![총선 끝난 지 얼마라고 벌써 ‘민심’ 곡해하는 정치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4/kuk202405140002.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