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약 개발에 주력하던 마이크로바이옴 업계가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자금을 먼저 확보한 뒤 신약 개발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놈앤컴퍼니, 쎌바이오텍, 엔테로바이옴, 고바이오랩 등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업체들이 ‘건기식·화장품 매출 확대’를 올해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건기식과 화장품의 수요가 커지자 이를 바탕으로 실적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놈앤컴퍼니는 13일 ‘2024 전략 발표’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상업화를 예고했다. 화장품 제품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메디컬 그레이드 프로바이오틱스(Medical Grade Probiotics)’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메디컬 그레이드 프로바이오틱스는 임상적으로 질병 개선을 입증한 프로바이오틱스다. 일반 건기식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
지놈앤컴퍼니는 사업 초기부터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 개발에 주력해왔지만 임상시험을 진행할수록 적자 폭은 커졌다. 이로 인해 2년 연속 5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새롭게 발을 들인 건기식, 화장품 사업에서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이며, 지난해 전체 매출의 15.6%에 달하는 22억원을 기록했다. 지놈앤컴퍼니 관계자는 “차별화된 컨슈머 비즈니스를 펼쳐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향후 임상 진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바이오랩은 2년 전 이마트와 합작 설립한 건기식 회사 ‘위바이옴’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건기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생산을 위한 익산 공장을 가동하며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고바이오랩의 경우 지난 2021년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피부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항암제, 비만치료제,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들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다. 그러나 임상시험에 차질이 생기고 기술이전 성과도 미진해 적자를 면치 못했다. 반면 위바이옴 매출은 설립 10개월 만에 100억원을 달성했다. 건기식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고바이오랩 관계자는 “건기식 사업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엔테로바이옴은 올해 호흡기 및 체지방 관련 개별인정형 건기식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양한 파이프라인 영역을 추가하고 효능성을 입증해 치료제 상용화 부문으로 영향력을 넓혀갈 방침이다. 또 쎌바이오텍은 프리미엄 유산균 브랜드 ‘듀오락’의 매출처를 다변화시켜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쎌바이오텍은 그동안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추진하며 쌓아온 자금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대장암 항암제 임상 1상을 진행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총칭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일반 약물보다 독성이 낮아 안전성이 높다.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뛰어들었고 암, 장질환, 안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겨냥한 약물을 개발하는 추세다.
하지만 성과를 보인 기업은 극소수에 그친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허가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은 미국 기업 세레스테라퓨틱스와 스위스 페링파마슈티컬스의 난치성 감염질환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 감염’(CDI) 치료제 단 2개 제품 뿐이다.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기업들도 아직 임상 1상 또는 2상에 머물러있다. 스타트업 규모의 기업이 대부분인 만큼 신약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임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인력 확보, 환자 모집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신약 개발이 더 늦어지더라도 투자 대비 상업화가 빠른 화장품, 건기식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마이크로바이옴 개발 업계 관계자 A씨는 “신약 개발은 짧아도 10년이 걸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모든 개발 단계를 투자금으로만 이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종목들은 면제받았던 30억원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익성 모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신약 개발이라는 장기전을 끌고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안정적인 수익이 개발의 필수조건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신약 개발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 B씨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임상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연구, 투자, 산학협력 등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내에서도 수조원 규모의 매출을 내는 ‘블록버스터’ 약물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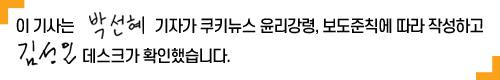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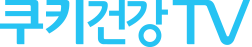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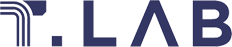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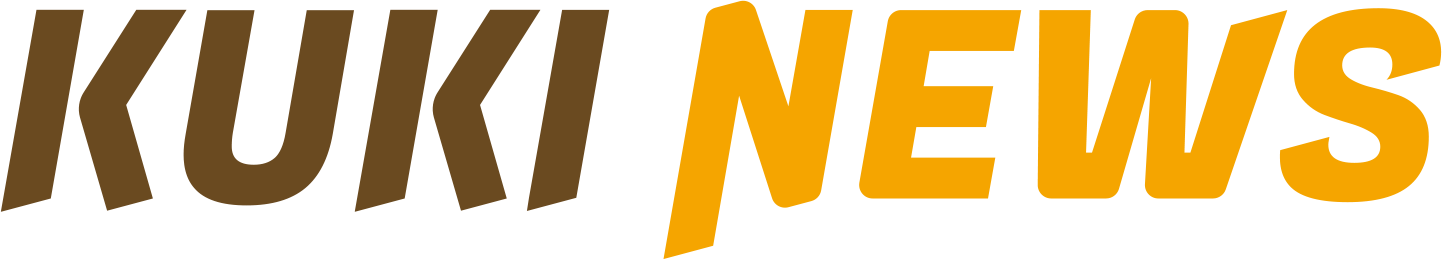





![‘제카’ 김건우 “1주 차 패배, 도약의 발판…젠지에 흠집 낼 것” [LCK]](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23/kuk202406230130.275x150.0.jpg)
![‘최하위’ 강동훈 KT 감독 “팀 정상화 중요…정신 차리겠다” [LCK]](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23/kuk202406230129.275x150.0.jpg)
![‘충격’ KT, 개막 4연패 수렁…10위 추락 [LCK]](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23/kuk202406230125.275x150.0.jpg)




![“의사와 이야기 하고 싶다”…말기 신장암 환자의 바람 [쿠키 인터뷰]](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21/kuk202406210307.300x170.0.jpg)









 포토
포토





![지진 강타...학교 등 시설물 정말 안전할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12/kuk202406120303.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