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강타...학교 등 시설물 정말 안전할까 [데스크칼럼]](/data/kuk/image/2024/06/12/kuk202406120303.250x.0.jpg)
지진이 강타한 부안지역에서는 학교나 건물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다. 초등학교 급식실 천장 구조물이 떨어졌고 중학교 숙직실이 부서지는 등 학교 건물이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지진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 건물에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2016년 경주와 1년 뒤인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이상의 지진 이후 전문가들은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에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지진으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를 목표로,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시설물(건축물)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진보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다. 꾸준한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법률에서는 연 2회 이상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육안에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한계로 지적된다. 안전등급에 따라 4~6년마다 실시되는 정밀점검도 센서나 기계를 이용하지만 보여주기식 연례행사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한 건 법과 제도의 영향이 크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90년대 대형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것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현실과 제도의 괴리는 ‘건물이나 다리는 100년이 지나도 안 무너져요’ ‘사람들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등 사회 곳곳의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가 최근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민간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나선 것은 반길 일이다. 또한 최근 마사회가 과천 경마공원 관람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고무적이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올해로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린 지 30년이 지났다. 이 참사로 무학여고생 등 3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다음해인 1995년에는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붕괴돼 1000여명 이상의 종업원과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부실관리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논란은 거셌다.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사고가 터지는 게 현실이다.
지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사회 곳곳에 위험은 더욱 커졌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첨단기술 도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의 개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재난은 발생하는 순간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태구 사회부장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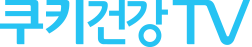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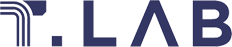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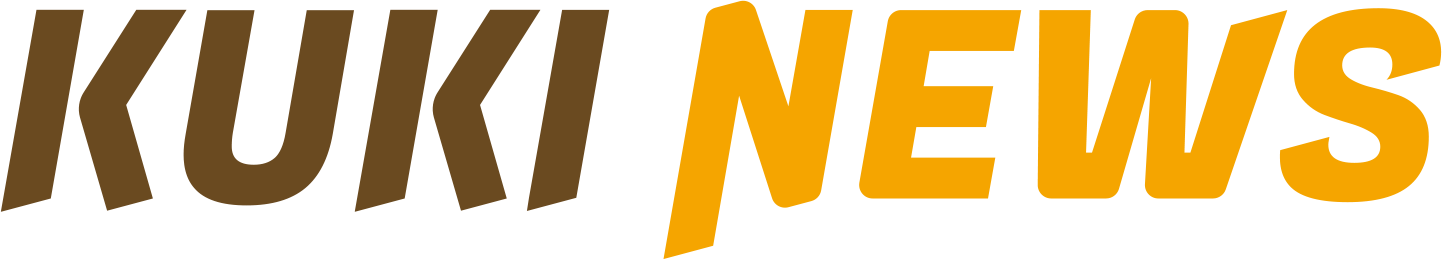





![‘쵸비’ 정지훈의 웃음 “코르키, 너무 많이 해서 슬슬 물리네요” [LCK]](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20/kuk202406200359.275x150.0.jpg)


![‘최하위 추락’ KT “준비한 것에 확신했는데…핑계 없다” [LCK]](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20/kuk202406200357.275x150.0.jpg)















 포토
포토





![지진 강타...학교 등 시설물 정말 안전할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12/kuk202406120303.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