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올드하고 포지션도 애매해서…요즘엔 그 브랜드 드는 사람은 못 봤어요.”
준명품 시장이 저물고 있다. 메트로시티, 루이까또즈 등 한 때 20대 초반에게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들도 최근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부터 핸드백 브랜드로 인기를 끈 루이까또즈와 메트로시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했다.
루이까또즈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션엘의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은 2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496억원으로 전년(572억원)보다 13.3% 줄었다.
메트로시티도 비슷하다. 메트로시티를 보유한 엠티콜렉션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62억원으로 1년 새 적자 폭이 30억원 늘었다. 매출도 724억원에서 646억원으로 10.8% 감소했다.
흔히 명품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중고가’를 확인하라는 말이 있다. 일반적인 중고 물품과 다르게 소장 가치가 있는 브랜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명품을 전문적으로 사서 되파는 ‘리셀러’들이 많은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들은 중고 미개봉 새상품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중고 의류나 잡화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등에서도 정가 26만8000원짜리 새상품 루이까또즈 반지갑을 12만원에 판매하거나, 40만원 상당의 미사용 메트로시티 숄더백을 10만원에 올려둔 판매자도 보였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준명품 판매 글을 올린 A씨는 “선물을 받았는데 들게 되지 않아 판매 글을 올렸다”며 “처음엔 정가의 반값에 판매 글을 올렸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조금 더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준명품이 외면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소비자들은 트렌드에 발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소비자 정모(33·여)씨는 “예전엔 준명품 브랜드의 지갑이나 숄더백 등을 몇 번 샀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실루엣이 너무 올드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라 차라리 비슷한 가격대의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사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30·여·가명)씨도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1학년이면 모를까, 가방을 주로 구매하는 나이대가 선호할만한 디자인은 아닌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는 브랜드는 아닌 데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는 것도 (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준명품으로 꼽히는 브랜드 중에선 유일하게 MCM의 매출이 늘었다. MCM을 운영하는 엠씨엠코리아의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43억원으로 지난해 (52억원) 대비 17.3% 감소했지만 매출은 20.9%(775억원) 증가한 937억원을 기록했다. 내수 시장에 집중한다기보단 해외 시장에서 폭넓게 활동한 결과다.
MCM은 지난해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디지털 중심의 브랜드로 다시 포지셔닝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베이프와 푸마, 크록스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고 컬렉션을 내기도 했다.
MCM 관계자는 “지난해 새로운 디렉터 임명 이후 디자인을 바꾸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라며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고객 참여를 유도했고, 지난해 새로 임명된 사빈 브루너 GBCO 아래 진행된 밀라노 프레젠테이션 등이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요즘엔 고객이 브랜드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라고 할 지라도 자기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사는 추세”라며 “심지어 소장가치가 없는 명품이라면 더 고객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준명품 브랜드 시장이 다시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신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말 꾸준히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현재 준명품 브랜드가 다시 전성기를 맞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포맷을 적용시키는 등 리브랜딩 과정을 거쳐 고객이 이 브랜드의 제품을 갖고 싶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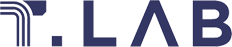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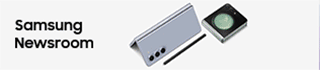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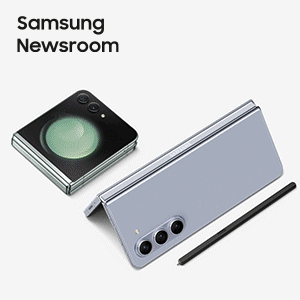
 포토
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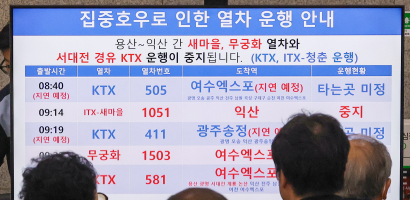


![시대를 앞서간 천재 이세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7/03/kuk202407030316.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