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앞서간 천재 이세돌 [데스크칼럼]](/data/kuk/image/2024/07/03/kuk202407030316.680x.0.jpg)
AI 등장 이후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이세돌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인간에게 오히려 매우 긍정적”이라며 “특별히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위로를 건넸다. 누구보다 먼저 인공지능과 맞섰던 ‘인간 대표’의 조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용하던 바둑계가 최근 부쩍 시끄럽다. 한국을 넘어 세계 여자 바둑 랭킹 1위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정 9단이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이어 9년 연속으로 주장을 맡고 있던 NH농협은행 여자바둑리그까지 연달아 불참하면서다.
바둑 동네를 오랫동안 살펴봤던 사람들에게는 기시감이 드는 광경이다. 15년 전이던 2009년, 당시 세계 최강의 기사였던 이세돌 9단은 한국바둑리그 불참을 선언하고 이어 ‘휴직계’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9단은 바둑리그 불참을 빌미로 한국기원이 징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휴직을 선택했다. 바둑리그 불참 과정에서 동료 프로기사들도 이 9단에게 ‘뭔가 조치하겠다’는 의결을 한 것이 휴직 결정의 배경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세돌은 바둑리그를 불참하고 중국 갑조리그에 출전한 이유를 직접 나서 소상히 설명했다. 당시 이 9단은 “중국리그는 제한시간이 2시간이라 세계대회와 비슷하다. 트레이닝이 된다”면서 “주장전이 있는 갑조리그 방식으로 인해 중국 강자들과 맞붙게 되므로 기량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한국바둑리그는 제한시간이 짧고 상위 랭커에 불리한 시스템”이라고 직격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 이세돌 [데스크칼럼]](/data/kuk/image/2024/07/03/kuk202407030218.680x.0.jpg)
한국리그는 5대 5로 대결해 승리가 더 많은 팀이 이기는 방식으로, 이 9단의 승리나 5지명의 승리가 모두 같은 1승이다. 반면 중국리그는 4대 4로 대결하고, 2대 2 승부가 나올 땐 주장전을 이긴 팀이 라운드 승리를 가져간다. 대우에도 차이가 크다. 이세돌 9단은 중국 갑조리그 출전 당시 1승에 11만위안(약 2000만원)을 받는 최고 대우 계약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 9단의 승리와 5지명 선수의 승리 모두 한국기원이 일괄 지급하는 ‘350만원’의 동일한 수당을 받는다. 이 9단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프로 선수의 가치는 상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대우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KB국민은행 바둑리그와 NH농협은행 여자바둑리그를 모두 불참한 최정 9단은 스스로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파편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라고 이야기 했다는 전언만 가득한 가운데 최 9단을 보유하고 있던 여자바둑리그 보령시 팀에선 ‘상금 배분 문제’가 요인이 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최 9단이 승리 수당 130만원인 여자바둑리그에 불참을 선언한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승리 수당 950만원짜리 여자 을조리그 경기를 8일간 7판이나 두고 왔기 때문이다.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일주일에 딱 한 판씩만 소화하면 되는 한국여자리그에 비해 타지에서 하루 쉬고 일곱 판을 연달아 둬야 하는 중국 여자을조리그가 더 강행군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중국 여자을조리그 7연전 직후 최 9단은 황룡사배에서 프로 데뷔 후 첫 ‘6연속 패배’를 당하면서 무너졌다.
휴직 선언 당시 이세돌 9단은 홀로 외로운 사투를 벌였다. 동료 프로기사 중 이 9단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반면 최정 9단은 국내 최대 기전에 연이어 불참하고 중국 여자리그에 참여하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바둑 유튜버’로 마이크를 잡은 프로기사들이 앞다퉈 최 9단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15년 전 시대를 앞서갔던 천재 이세돌의 강단이,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지 못했던 프로기사들의 채무감이 빚은 현상일까.
이영재 문화스포츠부장 youngja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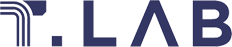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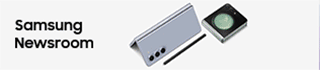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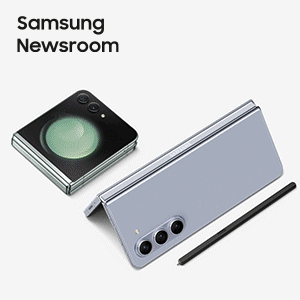
 포토
포토





![시대를 앞서간 천재 이세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7/03/kuk202407030316.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