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날 그 시간, 육군참모총장 연행이라는 군부 하극상(下剋上)사태로 한강 다리가 모두 봉쇄돼 벌어진 일이다. ‘괴물 군인’들이 고개를 처음 내미는 순간 한가히 멜로영화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듬해 서울의 봄,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대통령 출현을 겪으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환멸과 좌절감에 빠졌다. 1980년대 초반, 영화관 진풍경이 있었다. 본영화 시작 전 대한뉴스라는 걸 보여줬는데 뉴스 대부분이 대통령이었다. ‘그 꼴’을 볼 수 없던 일부 관객들은 담배 물고 우르르 휴게실로 나오곤 했다.
2024년 1월 1일 저녁, 영화 ‘서울의 봄’을 봤다. 정말 보지 않으려 했다. 보는 내내 화가 치솟을 텐데 왜 보냐는 생각이었다. 주위 관객석을 둘러봤다. 젊은 관객이 많았다. 젊은 층이 아니면 1200만 관객 돌파는 불가능했다.
MZ세대가 왜 이 영화를 볼까. 초반 관객몰이 할 때부터 궁금했다. 감독이나 출연자 모두 “잘 모르겠다. 얼떨떨하다”고 했다. 2030관객들이 서로 분노심박수를 측정해 SNS에 올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왜 열광하는 걸까. 반가움과 의문이 함께 들었다. 부모가 겪은 역사적 충격을 공감하고 싶은 걸까. 우리 역사 관심이 높은 걸까. 아니면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높아서 일까. 솔직히 내용이 즐길 만 한 것은 아니다. 영화 전개 속도도 빠르다. 12·12사태를 대충이라도 모르면 쉽게 따라올 수 없다.
영화 곳곳에서 하나회가 강조된다. 하나회가 뭔지 알까. 중노년층도 1990년대가 돼서야 알게 된 육사출신 군인 사조직이다. 문민정부때 언론이 앞다퉈 신(新)군부 집권스토리를 털어낼 때다.
하나회는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11기 전두환 중심으로 키워놓은, 있어서는 안 될 군내 패거리집단이었다. 그가 먹이(돈)와 권력(진급)을 던져주며 키웠다. 전두환·노태우의 12년 군인대통령 시대 토대를 깔아 준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많은 업적에도 과오를 떨칠 수 없는 이유중 하나다.
잘 알다시피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듬해 봄을 말한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소위 3김들이 정권을 잡을 거로 착각하고 제각기 목소리를 낼 때다. 이들과 국민, 모두 신군부가 소리 없이 권력을 잡아가는 걸 몰랐다. 그 실체가 처음 드러난 것은 1980년 4월 14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서리 임명이었다.
대학가는 5월이 되자 술렁였다. “군인들이 이미 권력을 잡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다. 부활한 총학생회들이 시위를 지휘했다. 시위는 성공하는 듯했다. 나설 것 같지 않은 학생들까지 참여했다.
![[조한필의 視線] ‘서울의 봄’ 정말 보고 싶지 않았다](/data/kuk/image/2024/01/03/kuk202401030489.680x.0.jpg)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을 수만명 대학생들이 점령됐다. 그날 모든 대학 시위대가 교문을 나가려 할 때, 전날과 달리 경찰 제지가 없었다. 그래서 신군부가 ‘5월 17일 계엄령 확대’ 핑계 마련을 위한 꼼수였다는 얘기가 후일 나왔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5월 30일 전두환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서울의 봄은 완전히 종식됐다.
서울의 봄은 빼앗긴 봄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봄이다. 그러나 MZ세대가 기억해주려는 것이 고맙다.
/천안·아산 선임기자 chohp11@kukinews.com
![[조한필의 視線] ‘서울의 봄’ 정말 보고 싶지 않았다](/data/kuk/image/2024/01/03/kuk202401030490.632x.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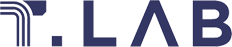



























![[조한필의 視線] 아산 현충사 일본어 안내판 '오류 10년'](/data/kuk/image/2024/04/04/kuk202404040529.68x68.0.jpg)
![[조한필의 視線] 80세 총장의 놀라운 프런티어 정신](/data/kuk/image/2024/03/18/kuk202403180041.68x68.0.jpg)
![[포토]'2024 과학축제' 국립중앙과학관 메타플리 인기](/data/kuk/image/2024/04/28/kuk202404280067.300x203.0.jpg)

![[인사] 충남도](/data/kuk/image/2024/04/22/kuk202404220036.70x50.0.jpg)


